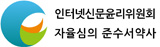(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기 1392년 조선 건국 직후, 정도전은 조선팔도 사람들의 특징을 사자성어로 정의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기 1392년 조선 건국 직후, 정도전은 조선팔도 사람들의 특징을 사자성어로 정의했다.
경기도는 경중미인(鏡中美人), 충청도는 청풍명월(淸風明 月), 전라도는 풍전세류(風前細柳), 경상도는 송죽대절(松竹 大節), 강원도는 암하노불(岩下老佛), 황해도는 춘파투석(春 波投石), 평안도 사람들은 산림맹호(山林猛虎), 마지막으로 함경도는 이전투구(泥田鬪狗)라고 말했다.
함경도 사람들이 이전투구 즉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와 같다는 말에 이 지역 출신 이성계의 안색이 붉어지자 정도전은 다시 함경도는 석전경우(石田耕牛), 곧 돌밭을 가는 소와 같은 우직한 품성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전 투구는 비단 함경도 사람들의 특징만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정치권과 같은 ‘권력’이 눈앞에 펼쳐지는 곳에서는 늘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치러진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 등에서 늘 보아왔던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은 한국세무사회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임 백운찬 집행부는 선거 후 신임 이창규 회장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들어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냈고 현 집행부는 이에 맞서 전임 집행부에서 내세운 회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원들을 해직시키고, 선거관리규정도 고쳐 이를 소급 적용했다. 전·현임 집행부 간의 법정다툼이 곧 벌어질 태세이며 사법당국으로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세무사회는 또 다시 분열의 길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세무사회의 선거를 둘러싼 이전투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년 임기의 회장 선거가 있을 때마다 아니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크고 작은 소란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 집행부에서는 3선 회장을 역임했던 전임 회장의 출마를 막기 위해 회장의 임기를 ‘평생 2번’ 최대 4년까지로 제한했고, 이 규정의 소급적용을 반대하던 부회장 등 임원들은 모두 쫓겨나야 했다. 이에 대한 후유증으로 인해 으레 회장 임기가 끝날 때 한번은 연임하던 회장 후보가 탈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지난해 세무사회의 임원 해직 사태는 2013년의 ‘데자뷰’다. 당시 3선에 도전하던 정구정 회장은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연이어 중임하지 않는다면 회장직은 얼마든지더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3선을 반대하던 임원들을 모두 해직시켰으니 말이다.
한국세무사회의 위신이 추락하고 분열과 대립이 시작된 것도 바로 이즈음이다. 그런데 다툼의 한 복판에는 ‘명예’뿐 아니라 ‘돈’도 자리하고 있다. 세무사회장에게는 임원수당 2억 원, 특별수당 1억원 등 연간 3억원의 수당과 함께 일반회계로 연간 170억원을 주무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회장직을 서로 차지하려는 아귀다툼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서글픈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분열극복, 소통 · 화합’은 각고의 노력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세무사회의 변화와 화합은 기대하기 힘들다.
세무사회장의 수당을 공인회계사 회장 수준 으로 줄여야 한다거나, 다시 예전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세무사회원들의 목소리에 세무사회 임원들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회원들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들이 세무사회를 이끌어 가기를 기대해 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