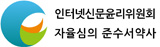![[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0310/art_16466188302011_010117.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영진들은 회사를 두 개로 분할할 때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공시해야 한다.
최근에 일부 기업들이 회사 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면서 대주주 지분율에는 전혀 손실이 없도록 하되 주주들이 쥐고 있는 주식가치 하락은 외면하는 일이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피해방지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보호대책도 해명도 기업 손에 맡긴 상태로 일반주주들에게 실질적인 보호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러한 내용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사안을 공개했다. 적용은 오는 5월 말 제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부터다.
가장 핵심적 내용은 기업의 사업부 물적분할로 손해가 예상되는 일반 주주들에 대해 자체 보호방안을 공시할 것을 명시한 것이다.
회사(A)가 사업부를 분할해 자회사(B)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기존 회사의 가치는 하락(A-B)한다. A회사 주주 입장에선 자신이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가 외형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나마 신설법인 B를 100% 자회사로 만들고, B회사 주식을 A회사 주주들에게 A회사 보유 지분율만큼 나눠주면 탈이 없거나 적다(인적분할).
그렇게 하지 않고 B회사를 상장시켜버리면 A회사 주주들은 A회사 주식 주가가 토막이 나는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물적분할). 명분이야 뭘 내세우든 결론은 A회사의 가치를 A회사 주주들에게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주주는 날벼락 맞지만, 지배주주는 돈 벼락을 맞는다. B회사를 지배하기에 충분한 지분율을 우선매수권 등으로 미리 확보하고 나머지 지분을 기업공개 및 상장으로 팔아 주가 폭등에 따른 차익을 챙긴다. 대규모 신규자금은 덤이다.
LG화학, 한국조선해양,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쪼개기 분할 사태가 줄줄이 터지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탄이 이어졌지만, 금융당국은 5개월 동안 손만 비비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에 나온 정책이 쪼개기 분할에 대한 첫 대책인 셈이다.
그런데 그마저도 실효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소액주주 보호대책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한 것까지는 좋은데 기업에 꼭 일반주주 보호대책을 만들라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물적분할 후 분할 사업부를 신설법인으로 하여 상장한다해도 대박이 무조건 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지만 최근에 상장한 IPO 대어들의 경우 에너지, 유통 등 대박 내지 최소한 중박 이상급이 충분히 예단되는 경우만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코스를 밟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일반주주 손실이 상당부분 우려된다.
금융당국은 기업이 대책을 만들고 대책을 만들지 않을 경우 해명하며, 해명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거래소의 정정 공시 요구,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벌점 등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히긴 했다.
그간 금융당국의 전례를 살펴보면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예단할 요소는 없다. 쪼개기 분할로 논란이 됐지만, 결론은 ‘기업 자율’에 맡겼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후 5개월이나 지나서 내놓은 대책인데 대선판에서는 양강 대선후보가 일반주주 보호 의무화를 강력히 주장하는 가운데 ‘기업 자율’에 그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 대상은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다.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 항목을 작성 시 소액주주와의 소통 사항을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이밖에 기업들이 계열사들과 내부거래를 하거나,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내용과 사유를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하도록 했다.
최고경영자 승계 시 대표이사 선임 절차만 쓰지 말고,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의 주요 내용을 문서화해 명확히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감사위원회 설치 예정이라면 이를 또한 보고서에 써둘 것을 명시했다.
당국은 기한 미준수, 허위 공시, 공시 누락 등의 거래소의 정정 공시 요구,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벌점 등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