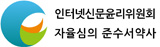(조세금융신문=이소연 작가) 내가 입사 1년 차 만에 후배를 두게 되었던 때의 이야기다. 17년도 말 혹은 18년도 초가 되겠다. 벌크 채용이라는 이름으로 신입사원이 대거 입사했다. 신입사원의 수가 늘어나며 그들이 가진 목소리의 힘도 커짐을 느낄 수 있었다. 사건(?)의 발단이자, 변하고 있는 조직문화의 시작을 느꼈던 그날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고객들로 들끓는 사무실에 바쁘게 서류를 넘기고 있었던 시점이었다. 쌓여가는 서류를 끼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며 고객에게 이해를 구하고 있었다. 조금 한산해졌을 때, 결재를 올린 것에 문제가 있는지 상사는 나를 불렀다.
“소연 씨, 이리로 와보세요.”
나는 그의 옆에서 내가 처리한 업무에 대한 정당성에 관해 설명했다. 내가 사장이어도 업무를 이렇게 처리할 것이냐는 물음에 기분이 상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어색한 미소만 띈 채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김 대리, 이리로 와보세요.”
상사는 내가 한 업무처리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했는지 내 후임자, 그러니까 이제 막 업무를 시작한 6개월 차 신입직원을 불러 판단하도록 했다. 김 대리는 나와 같은 의견이며, 정당하다는 말을 풀어서 전했다. 상사는 그제야 만족한다는 듯이 결재 버튼을 눌렀다. 삼십 분이 지나있었다.
그날 오후 인사를 담당하는 팀의 팀장이 나의 상사를 호출했다. 문밖에서 오가는 목소리는 논쟁하듯 날이 서 있었다. 이윽고 상사는 멋쩍은 얼굴을 한 채 사무실에 돌아왔다. 그리고 사무실 한가운데로 와서 말했다.
“내가 소연 씨는 소연 씨라고 부르고, 김 대리는 김 대리라고 부르는 게 잘못됐단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불편했다면 미안합니다.”
상사는 꾸벅 머리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못 볼 꼴을 본 사람처럼 마음이 불편하고 부끄러웠다. 퇴근 후 집에 가는 내내 상사의 사과를 떠올렸다. 그리고 나의 불편한 마음이 파생된 이유에 대해서 고민했다.
‘대리’와 ‘씨’의 차이는 뭘까? 김 대리도, 이소연 씨도 모두 직책은 ‘사원’이다. 그중 대리는 없음에도 왜 우리는 ‘대리’와 ‘씨’사이에서 불편함을 가르고 있을까? 나는 의아했다.
상사의 사과를 듣고서야 알았다. 나는 ‘대리’라고 불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소연 대리보다 이소연 씨가 나와 더 잘어울린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고의가 아니었다는 상사의 말을 누구보다 잘 알아들었던건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아니었을까. 그 깨달음은 나를 불편하게 했다.
나는 내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김 대리도 나와 같은 주장을 하지만 내 이야기보다 더 신빙성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나조차도. 못 볼 꼴을 본 게 맞았다. 자신의 1인분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나와 직면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불편하고 부끄러웠다.
MZ세대라는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상황이다. 나는 인사팀장에게 가 불편함을 토로하지 않았다. 아니, 심지어 그것이 불편한 일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평등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알아채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건의했다. 나는 그 당당함에 놀랐고, 더 나아가 시대가 변하며 사원들의 생각의 기준도 상향됐음을 느꼈다.
나는 묻고 싶다. 그때 내가 1인분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신입이라, 아직 어려서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프레임은 누가 씌워두었는지. 그래서 결국 밀려드는 업무를 제시간에 처리하면서도 왜 그렇게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 느꼈는지. 그때의 나에게 직접 묻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이 상황이 불편한지에 대해.
그 당시 우리 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이 단순한 헤프닝으로 보이는지. 새로운 세대의 등장으로 인한 변화로 느껴지진 않는지. 그저 쉽게만 여겼던 신입사원들도 입장을 낼 수 있다는 선전포고로 느껴지진 않는지 묻고 싶다.

[프로필] 이 소 연
• 만 24세
• 고졸(대학 재학중)
• 공기업 사무직
• 브런치 작가 활동, 직대딩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