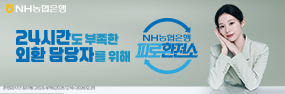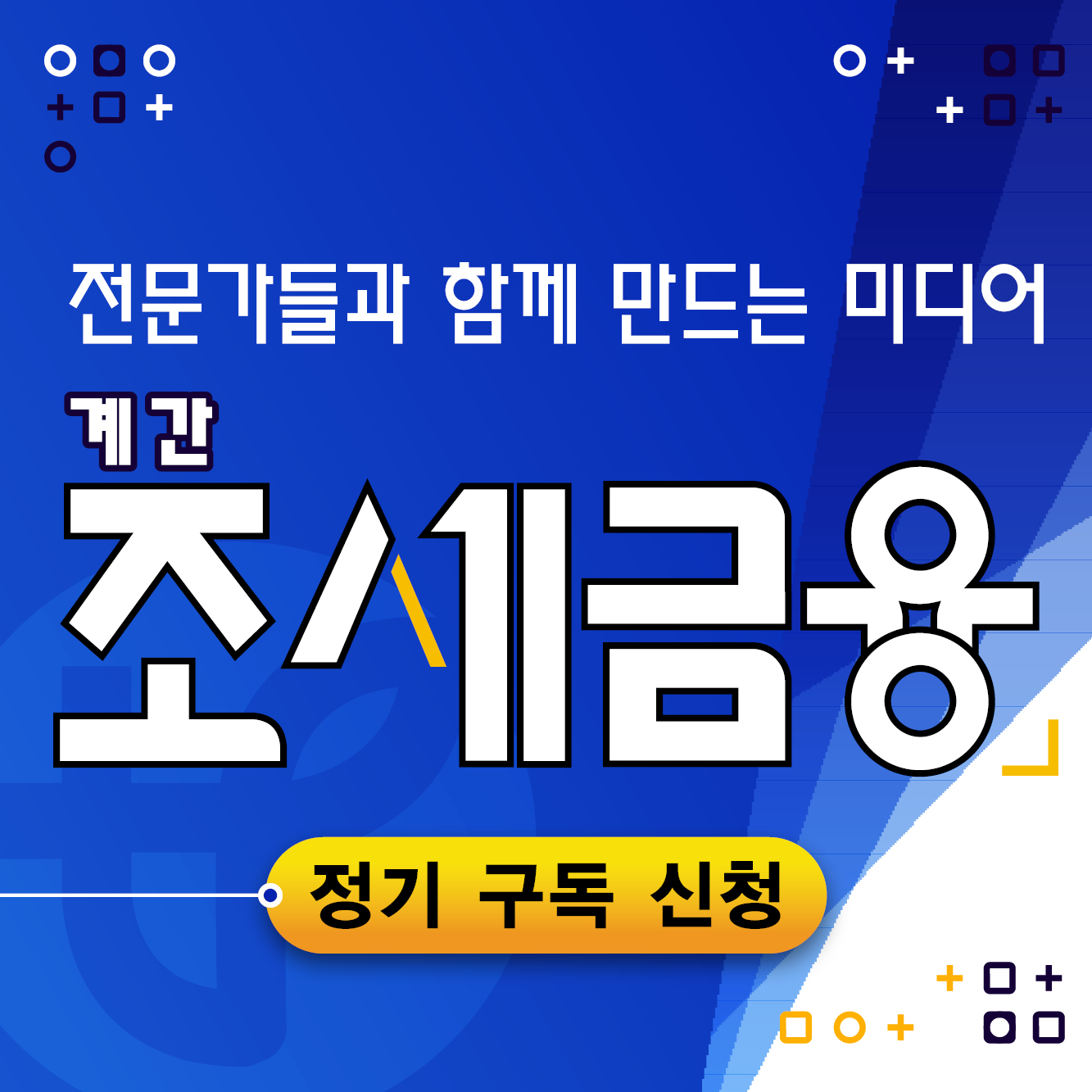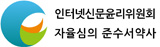![[사진=광장]](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40522/art_17168739932805_483dd5.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23일 글로벌 비영리 단체인 FPF(Future of Privacy Forum)와 더불어 ‘생성형 AI에 대한 국내외 규제(Regulatory) 프레임워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챗GPT(Chat GPT)를 필두로 생성형 AI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APAC 지역(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EU, 미국 등 전 세계 AI 법적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추세와 산업계 동향을 심도 깊게 분석했다.
축사는 광장 이형근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차관, 환영사는 FPF의 CEO인 줄스 폴로넷스키(Jules Polonetsky)가 맡았다.
강도현 차관은 앞선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AI 서울 정상회의 서울선언 및 의향서’, ‘서울 기업 서약’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공유했다.
첫 번째 기조연설로, IBM의 AI 윤리위원회 의장인 크리스티나 몽고메리(Christina Montgomery)가 신뢰성 있는 AI를 구현하기 위한 AI 거버넌스 및 개방형 혁신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이 신뢰할 수 있는 생성형 AI 성장 여건 조성을 위한 위원회의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업계와 국민 권리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사진=광장]](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40522/art_17168739910343_8cd8fe.jpg)
첫 번째 발제에서는 광장 고환경 변호사(연수원 31기)이 ‘한국의 최근 AI거버넌스 및 규제 현황’을 주제 발표했다.
고 변호사는 개인정보, 금융 등 AI 관련 주요 부분별 국내 규제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국내 입법 현황도 면밀히 검토한 후 AI가 성장‧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민간의 창의성을 보장하는 실용적인 규제 프레임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PF의 APAC 지역 대표인 조쉬 리 콕 통(Josh Lee Kok Thong)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생성형 AI 시스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탐색’을 발표하며, 생성형 AI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 상황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APAC 국가의 규제 프레임워크 및 그러한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법 간의 관계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AI 거버넌스에 관한 정부와 산업계의 best practice를 제시했다.
토론은 광장 박광배 변호사와 FPF 조쉬 리 콕 통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패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양청삼 국장,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김범수 교수, 네이버 이진규 CPO, SK텔레콤 김호근 법무담당, 구글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경쟁력·AI 정책 부문 유니스 황(Eunice Huang) 부문장, 메타 멜린다 클레이바우(Melinda Claybaugh) 개인정보보호 정책 책임자 등이 참여했다.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은 대한민국 AI 안전 연구소의 연내 출범을 포함, ’서울 선언’을 실현하고 AI안전 확보와 지속가능한 AI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양청삼 국장은 개인정보호호위원회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이 갖는 불확실성임을 언급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호근 법무담당은 경성 규범이 아닌 연성 규범에 따라 AI 관련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AI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한 저작권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진규 CPO는 AI 개발, 적용, 이용 등 AI 활용의 전 국면에서 다양한 주체가 연관되어 있기에 AI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등의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점과 생성형 AI에 의하여 부정확한 정보가 생성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정정권 행사를 통한 정정 등 전통적인 개인의 권리 구제 방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 생성형 AI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들을 지적했다.
김범수 교수는 딥페이크 등 AI관련 용어들의 통일성 있는 사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AI 에코 시스템 등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멜린다 클레이바우는 각국에서 AI 규제안을 독자적으로 확립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국제적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규제를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니스 황은 EU 및 미국의 AI 규제를 언급하며 생성형 AI 등 급변하는 AI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