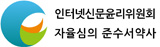(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공직생활 20년 끝에 로펌으로 이직하여 낯선 근무를 막 시작할 때다. 공직에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중 하나가 변호사 간 호칭이었다.
비슷한 연배의 동료나 후배 변호사를 부를 때 이름과 변호사를 합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축약해서 ‘김변’, ‘강변’ 등으로 불렀다. 택스그룹 內 그룹장 변호사님의 성은 소씨였다. 누군가가 ‘소변!’ 이라고 부를 때마다 머리속에서는 웃음이 굴러다녔다.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지를 물어본 적은 없다.
당시 세무사들 사이에서나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동료들이 세무사를 호칭할 때는 ‘김세’, ‘강세’ 등으로 부르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회계사나 관세사 등 다른 전문직 동료 간 호칭도 축약해서 부르진 않았다.
시간이 지나 세무법인을 설립하여 근무 세무사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 젊은 세무사들은 상대방을 부를 때 ‘김셈’, ‘강셈’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김세’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에서 선생님과 학생 간 수평적 호칭제 도입과 관련하여 선생님 호칭을 ‘쌤’으로 하는 것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다.
개인적 생각이긴 하나 선생님들 동료 간에 쌤으로 호칭하는 것은 별반 이상하게 들리진 않는다. 다만, 학생이 선생님을 ‘○○쌤’이라고 부를 경우 뭔가 모를 불편함이 남는다. 좀 이상하다.
그렇다고 과거 언어의 의미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언젠가 학생이 선생님을 ‘○○쌤’이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다. 추후 보도를 통해 당초 우려했던 일은 일종의 해프닝으로 이해되긴 했으나 잠시나마 파장이 있었던 것 같다.
공직에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성에다가 해당 직급이나 직위를 합쳐서 불렀다. 김 주사나 김 과장, 김 서장, 김 국장 김 청장 등의 형식이다. 일반기업에서 김 부장, 김 상무, 김 사장 등으로 부르는 것처럼.
이와는 달리 편한 사이의 동료나 약간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김형이나 김박사라는 호칭이 있었던 것 같다.
부담이 없는 동료나 후배 등의 관계에서는 직급이나 직위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대부분의 호칭에서 존칭의 언어를 사용했던 기억이 난다.
우리말에는 격이 있다, 대화의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단어의 선택이 달라진다.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된 단어를 사용할 경우 무례하다거나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우리말을 처음 배우는 외국인들의 상당수가 동일한 의미를 표현할 때도 상대방이 누군지에 따라 다른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한다.
실례로 영어로는 상대방을 ‘You’ 하나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적합한 단어가 다르다. 그것이 우리의 언어다.
2002년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대니얼 카너먼은 경제학자가 아닌 심리학자였다. 그는 실험을 통해 사람들의 경제적 선택이 프레임(고정관념 등의 의미)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입증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우리의 언어 중 ‘호칭 프레임’에 대한 위험성을 완전히 부인하긴 어렵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실종된 호칭은 화를 불러올 수 있다. 호칭에 따라 사회적 품격이 달라지기도 한다.
사람들끼리의 호칭은 서로를 대하는 정서(느낌)이다. 그리고 소통의 연결수단이다. 복잡하고 바쁜 시대에 축약된 언어는 나름의 편리성과 유익성도 있다. 그러나 부르기뿐만 아니라 듣기도 좋아야 하고 사회적 공감 내지 동의도 필요하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통용이 된다.
김셈이 좋다. 김셈이라 부르는 당신도 좋다.
 [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 국립세무대학 3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