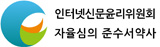(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11여 년 전, 집식구 이름으로 조그맣게 텃밭용 땅을 샀다. 공직을 퇴직하고 받은 퇴직금과 로펌에서의 소득 등 이리저리 돈을 보탰다. 20년 넘게 묵묵히 내조해 준 고마움과 미안함에 대한 표현이기도 했다.
그녀는 부동산중개업을 한 이력이 있었고, 당시 경제학 석사였던 필자도 나름 물정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고 보니 맹지였다.
해당 토지는 지난해 3기 신도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연말에 토지보상 계약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정부시책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지정된 당일에 바로 계약까지 마쳤다. 그날 저녁, 11년 농사일을 마감하는 자축의 자리를 마련했다.
첫해와 그다음 해는 전 주인처럼 옥수수와 호박, 고구마를 심었다. 전업주부로 살다가 자신의 땅이 생기니 의욕을 보였다. 농사 초보자라 걱정은 됐다. 이랑과 고랑을 만드는 것도 육체노동과 경험이 필요하다. 잡초제거도 마찬가지다.
뽑고 또 뽑아도, 검은 비닐을 씌워도 질긴 생명력을 감당하기 어렵다. 필자는 소유자가 그녀임을 핑계로 엔간해서는 농사일을 거들지 않았다.
어느 해 3월경이었다. 잡초를 태우다가 불길이 바람과 함께 밭 전체로 번진 적이 있었다.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면서 전화가 왔다. 울음과 무서움에 뒤범벅되어 있었고, 외투를 벗어 불을 끄고 있다는 다급한 목소리는 파르르 떨고 있었다.
누군가가 119에 연락을 했고, 헬기까지 떴다. 다행히 불은 꺼졌다. 그날 밤, 불에 그을리고 탄 머리카락과 옷을 보여주면서 옆 밭의 비닐하우스까지 번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며 울다가 웃는다.
동네 텃세라는 것도 있다. 텃밭 주변은 대부분 미나리, 부추 등을 비닐하우스로 대량 재배하고 있었다. 유독 우리 텃밭이 물에 자주 잠겼다. 누군가가 대놓고 밭둑을 파서 물이 들어가도록 했다. 버려진 미나리나 부추와 농약병 등 갖은 쓰레기를 갖다 버리기도 했다.
농기구를 차에 싣고 다니는 것이 불편해서 농기구 보관시설용으로 작은 막을 설치한 후 그곳에 삽이며, 괭이, 호미, 낫, 장갑, 호박 묘종 등을 보관해 뒀는데, 그다음 날 가니 몽땅 사라졌단다.
그녀는 밭두렁 주변에 경계목으로 벚나무를 심기로 했다. 나무가 잘 자라니 보호목으로 적격이라면서. 이제는 농작물 대신 유실수를 심어야겠다고 했다. 농작물 경작은 힘만 들고 경제적 실익도 별로 없었다.
그리고 선택한 것이 ‘매실나무’였다. 70여 주의 묘목을 샀다. 개중에 30여 주는 꽃을 피우지 못했다. 심은 지 3~4년부터는 매실 수확이 가능해졌다. 5~6년차가 되면서 연간 220㎏ 정도를 수확했다. 그 이후에는 친환경 유기농 탓인지, 연간 100㎏ 정도로 줄었다.
다른 농작물 관리보다 수월했지만, 전지작업과 잡초제거, 그리고 수확도 만만치 않았다. 언젠가는 그녀 혼자 전지작업을 하고 있으니, 이웃 주인이 “아니 그 집 아저씨는 뭐하시고 매번 혼자 나와서 고생하시냐”는 소리를 들었단다. 그러는 사이 동네 사람들과의 친분도 한겹 한겹 쌓여갔다.
결실의 계절이 되면 동네 지인들과 수확의 기쁨을 나누었다. 알고 지낸 지 20년이 넘은 태준이네‧혁주네, 사루‧재금이 언니, 진숙씨 등이 단골 멤버였다. ‘세라비’(c'est la vie)라고 했던가. 풍요로운 해도 있었지만, 벌레들이 기성을 부려 제대로 된 매실을 구경하기조차 힘든 시기도 있었다. 매실을 잘 다듬어서 20ℓ짜리 유리병에 설탕과 다져 넣은 후 1년을 묵혔다. 액기스는 친척들과 지인들에게도 나누어도 주고,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먹고도 있다.
한껏 분위기가 오르고 그녀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갈 즈음,
“그런데 보상금 나오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 그거, 당신이 8년 자경했으니 세금은 안 나올걸?” “…” “묘목, 농기구 등 구입한 증빙 있지? 사진 찍어 둔 것도 있지?” “뭐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야, 안 내도 된다는 거야?”
“당신이 자경했다는 명백한 증거인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웅다웅 그렇게 밤은 깊어 갔다.

[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 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 국립세무대학 3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