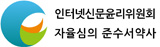(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잠을 이루기 힘든 저녁이 있다. 째깍째깍 심장 뛰는 소리가 밤12시를 넘겼다. 평소라면 저어할 일이지만, 맥주 한 캔을 냉장고에서 꺼냈다. 소시지를 안주 삼아 거친 호흡과 함께 삼킨다. 세무사는 긴장의 숨을 고른다. 오래되어 기억이 가물가물한 채용 면접 전날 밤을 떠올려 본다.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오늘은 세무사가 의뢰받은 사건 중 세금 과세가 정당한지를 결정하는 회의가 있는 날이다. 눈을 뜨자 베개와 이불을 눈에 거슬리지 않게 손으로 쓸어내며 가지런하게 정돈한다.
신문을 가지러 나가기 전 항아리모형의 도자기 어항에서 스킨답서스 수림 아래 모여 사는 십여 마리의 핑크 테일 구피 가족과 미니비트로 아침 인사를 나눈다. 그리곤 신문을 들고 화장실에서 평안한 글귀를 찾는다. 이어 샤워를 한다.
칫솔질에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샴푸나 린스를 눌러 사용하는데 손밖으로 흘러내리면 찜찜하다. 면도할 때 작은 상처라도 생기면 꺼림칙하다. 머릿결이 맘에 안 들어도, 스킨로션이 피부에 골고루 스며들지 않아도 신경 쓰인다. 서랍을 열어 속옷을 챙기는 데 손이 멈칫거리는 것도 불편하다. 평소에는 아무 상관 없는 일들이다.
세무사는 출근길에 어제 논의했던 주요 이슈를 머릿속으로 그린다. 그리고 쟁점과 핵심을 입속으로 되뇐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내부미팅이다. 동료직원들의 얼굴을 살핀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전화기, 노트북, 안경, 손 세정제, 메모지, 계산기, 노트, 삼다수 생수와 만년필·형광펜·칼·볼펜·연필 등이 담긴 검은색필기구 통이 원래의 자리에 놓여 있는지. 책상 주변의 가습기며, 모래시계, 직원이 직접 만들어 생일선물로 준 클레이 인형, 가족사진 등도 눈에 들어온다.
읽다 만 “비나 벤카타라만의 포사이트”, 다시 또 읽고 있는 “최인철 교수의 프레임” 등 함께 놓여 있는 책들의 정돈 상태에 눈길이 스쳐 지나간다.
서울서 세종까지 대략 2시간 거리다. 동승한 동료도 세무사처럼 밤잠을 못 이뤘는지 얼굴이 부었다.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려 애쓴다. 이럴 때는 부담 없는 이야기가 제격이다. BTS 등 K팝 가수도 등장한다.
바로 옆에서 대형트럭과 승용차들이 소리 없이 미끄러진다. 그 너머로는 가로수의 초록이 지쳐간다. 들판에서 곡식들이 술렁거리고 저 멀리 야산에서는 저마다 머리 손질로 부산하다.
세무사는 육체노동자임이 틀림없다. 아이디어만으로 끝나는 직업이 아니다. 고객을 만나고 자문업무 과정도 행동하는 것이다.
서류 작성은 손을 움직여야 하고, 필연적으로 말로 표현해야 한다. 잠자코 생각하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써야 만이 비로소 완성되는 일이다. 휴일에 고객이 만나자거나 새벽 메일이나 메시지에도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하다.
세무사는 인생을 곱절로 사는 셈이다. 그 하나는 직장인이나 사업가처럼 일상의 생활인으로 사는 삶이다. 그 두 번째는 일을 맡긴 사람을 대리한 삶이다. 당사자로서 본래의 삶이 누구나 겪게 되는 일상적인 것이라면, 대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다.
세금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매개로 한동안 이입되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여적도 보게 된다. 좋은 모습과 궂은 모습도 있다. 공감할 부분도 있고 다소 의외일 때도 있다. 이후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긴다.
회의는 내·외부 위원, 처분청과 대리인, 그리고 관련 실무담당자 몇 명이 참여하는 각본 없는 드라마다. 사전 결론 없는, 희극과 비극이 공존하는 무대다. 조금 떨어져 앉은 곳에서 ‘세금 과세는 정당하다’는 목소리가 모데라토보다는 알레그레토에 가깝게 흘러간다.
세무사의 외침은 주기도문을 외우는 심정이다. 그 호소 속에는 간절함이 배 있다. 행렬 인파 속에 엄마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 꼭 잡은 어린아이의 고사리손처럼.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사람들은 같은 강에 발을 담그지만 흐르는 물은 늘 다르다”고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다.
누군가는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며,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납세)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설명을 통해 동의도 얻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인슈타인도 공감한, 과학보다 예술보다 어려운 것이 세금일지 모르겠다. 세무사의 시월의 하루가 간다.

[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 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 국립세무대학 3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