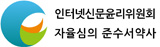(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 만능주의가 불러온 결과물이다. 그냥 염불보다 잿밥에 더 눈독이 들었냐고 묻고 싶을 정도다.
그 무렵이다. 어느 세무서장의 회고담이 심금을 울린다. 하루는 아들 녀석이 생활기록부를 불쑥 내밀며 “선생님이 아버지 직업을 구체적으로 적어오라고 했어요”라고 하더란다. 순간 놀라 멈칫했단다. 그는 국세청 공무원이라고 적어 보내기를 주저했다고 한다. 얼른 지인의 회사명과 직급을 적어 보냈다면서 계면쩍어한다. 제 딴엔 멸사봉공 지극정성으로 ‘세금 곳간 지킴이’로 나랏일에 올인했는데, 정말 어째서 망설이었을까. 그는 쓴웃음을 짓는다. 국세청 공무원이라고 왜 사실대로 적지 못했을까.
어쨌거나 이유인들 알듯 말듯 하다. 그러나 당시의 국세청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그 세무서장의 가슴 쓰라린 사연을 어쩌면 한 번쯤 공감하였으리라고 넌지시 살펴지게 된다. ’70년 초부터 ‘살아있는 국세청’을 취재 보도한 나(필자)를 ‘반(半)세무공무원이 다 됐다’고 농반진반 별칭으로 불러 주었던 그때 그 인사들의 별난 자취가 생생하다. 당시 일부 고위급취재원들의 하늘 높은 줄 몰라했던 냉랭한 친근감이 주마등처럼 스치니, 그리 짐작이 간다.
-이재명 정부 탄생, 시스템 새로 구성하는 이즈음이 딱 맞는 골든타임
-내국세 과세행정 기능만 따지면 신설 ‘예산처’로 승격 편제돼야 합당
-특정직 전환해도 인사 보수 현실화 안 되면 공염불이나 다름없어 봬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60년 응어리 만방에 소리쳐 보지 않으리
특히 최근 들어 AI 기술과 관련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실무적인 세무행정에 접목, 운영으로 국세 행정의 전문성 강화가 한 걸음 더 빠르고 넓은 확장성이 요구되는 새 시대가 온 것이다. 1999년부터 국세청에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진다. 그러나 그렇게 간절한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빛을 못 본다. 한동안 ‘국세청법’ 입법화 움직임이 지지부진 유야무야(有耶無耶)한 원인도 그중 하나다.
드디어 국세청이 변화의 눈을 멀리, 그리고 크게 뜨는 한 해가 다가오고 있다. 국세청장 인사 교체가 빈번하게 단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국세 행정의 독립성을 지켜나가기가 사실상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행스럽다. 2년 임기(중임 금지) 법정화된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이 진작에 이뤄졌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요즘 들어 위정자들 주위에서 부쩍 고개를 드는 분위기이다.
설령 국세공무원을 특정직으로 전환한다 해도 인사나 보수 현실화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공염불로 그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특정직 전환만으로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세무 부정부패가 말끔히 사라질지는 의문의 여지가 남기 때문이다.
조세 제도나 행정 개선을 통해서 국세공무원의 재량권 축소 탈피 등 자의적인 개입 소지를 풀뿌리부터 제거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지는 꽤 오래다. 그러나 납세자뿐만 아니라 과세당국 안에서조차 세무조사 후유증을 안고 있어 온 터여서 정치적 세무조사 문제가 늘 논란의 대상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결정결의서 내용이 완전무결해서 흠잡을 구석이 없어도 표적조사라는 꼬리표 때문에 정치적 세무조사로 덮어 씌워질 가능성을 항상 안아 올 만큼 현안 과제가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태광실업 회장을 겨냥한 세무조사,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과정에서 청와대 압력으로 이뤄졌다는 세무조사도 조사권 남용을 부정하지 못할 한 단면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정치적 세무조사 적폐청산에 방점을 찍은 한승희 전 국세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창한 의지와는 달리 현실이 너무 거리가 멀었던 탓인지 끝내 그 벽을 넘어서지 못 했고, 국회 인사청문회 때 강민수 국세청장은 “정치적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세무조사 로드맵을 천명할 만큼 암 덩어리 닮은 ‘세정악재’가 맞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실오라기만큼이라도 작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에는 정말 힘들다. 그간의 정치적 세무조사 적폐와 견주어보더라도 우려의 목소리가 질기게도 사그라들지 않는 정황을 부정할 수 없기에 더 그러하다.
과세당국이 꿋꿋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본분을 지켜나가려면 독립성과 중립성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세간의 전문가들이 줄곧 입을 모아온 이유다. 근래 들어 국세청이 특정직 전환을 위한 ‘국세청법’ 제정에 몰입하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한숨 놓인다. 국회를 비롯 조세 관련 학회 학계 등에서 국세청법 도입 제정에 앞다퉈 연구조사, 발의한 내용을 공유하고 집대성해서 햇빛을 보게 할 계기로 삼았으면 해서다.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을 기점으로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새로 들어섰다. 정책수립과 재원 배분에 예산 편성 권한을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기획재정부를 재편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움직임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싹트고 있다.
예산처를 신설, 예산 편성 기능을 이관하고 재무부와 업무를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획재정부의 개혁으로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변화의 총체적 기류가 같은 방향으로 착착 추진되고 있으니 법 개정 시행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새 정부의 새로운 국정 시스템이 짜지는 지금이 국세청이 노심초사하는 방향성과 절묘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골든타임이 될지 모른다. 내국세 과세행정 기능만 따지면 신설되는 예산처 산하기관으로 국세청이 승격 편제됨이 합당하다는 소견이다. 문제는 입법국회의 법리에 대한 선호도다. 우는 아이에게 젖 주듯 조세심판원이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편제된 사례처럼 말이다.
좀 과하긴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국세청 구성원들이다. 그들만이 지닌 독특한 전통을 한데 모아 다시 한번 웅비의 나래를 펼쳐 보았으면 해서다. 기회는 찰나와 같아서 한순간에 곧잘 나락에 빠져든다.
만지작거리지도 말고 주춤거리지도 말자고 통 크게 한 수 거든다. ‘절호의 찬스’가 2027년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제2의 국세청을 개청한다는 당찬 신념으로 함께 우뚝 서기를 학수고대한다. 이참에, 정녕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라고 응어리진 가슴이 터지도록 만방에 소리쳐 보지 않으려는가.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