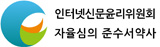(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사법부 자체의 이해관계를 위해 엄정한 독립을 전제로 한 재판과정에 관여, 행정부가 요구하는 것에 맞춰 재판거래를 했으며, 기타 블랙리스트 작성,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의혹이 재판대에 올라서게 되었다.
국가권력기관 중 정의와 평형을 가장 중요시해야 할 기관이 사법부이다. 법과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눈을 가리고 한 손에 칼을,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 법 앞에서의 평등, 엄중한 처벌, 엄정한 판단을 하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절대적 사명을 띤 사법부가 스스로 여신 디케의 눈가리개 대신 잘 보이는 안경을 끼고, 한 손에 든 칼 대신 부지깽이를 들었으며, 또 다른 손에는 저울 대신 주워 담을 바구니를 들어 재판에 임했다. 안경, 부지깽이, 바구니를 든 여신 디케의 모습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고 가관이다.
이런 추한 모습의 여신 디케를 또 다른 여신 디케가 재판한다니 정말 정의와 평형의 판결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다른 여신 디케가 눈을 가리고 있는지 양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새삼 주권자인 국민의 따가운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18세기 루이왕정을 무너뜨린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국가권력은 왕정주의인 일권집중체제에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체제로 전환되었다. 일권체제에서 나오는 독재, 부정, 부패, 불평등 대신 공정, 평등,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권력을 법을 만드는 국회, 법을 집행하는 정부, 법을 판단하는 법원으로 분할하여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이 삼권분립은 마치 고대 중국천하를 제패한 제왕의 상징물로 ‘정정(正鼎)’이란 솥이 있다.
이 솥은 세 개의 다리로 받침을 하고 있어 넘어지지 않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 고대 중국에는 천하를 제패한 제후가 이 거대한 솥을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세워진 솥과 같이 든든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패도를 발휘하라는 것이다.
현대 권력에 비유한다면 국회, 정부, 사법의 세 개의 다리로 국가체제를 안정되고 튼튼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세 개의 다리로 삼권분립을 한 국가권력체계에서 이번 사법농단은 세 개의 다리를 두 개의 다리로 만들려고 한 은밀한 공작이나 다름없다.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체계를 이권분립으로 바꾸려는 의도나 마찬가지이다.
사법부가 행정부와 야합해 서로의 이해관계에 상부상조한다면 이는 동일한 기관일 뿐이다. 작금에 벌어진 사법농단을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열거할 수 있다.
첫째로, 삼권분립의 경계선이 모호해 과도한 견제와 균형이 오히려 국가정책의 효율성을 떨어트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둘째로, 솥의 세 개 다리, 국회, 행정, 사법인 세 개의 다리가 서로 두께를 달리하는, 즉 권력의 힘이 불균형을 이룬다면 이 솥은 균형을 잃고 쓰러진다는 점이다.
셋째로, 법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체계는 이권분립을 일으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필자는 일련의 사태를 맞이해 미국 초대 대법원장인 존 제이의 일화가 더욱 생각난다.
18세기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당시 전쟁에 휩싸인 영국과 프랑스 간의 사이에 어떤 외교 자세를 취할지에 대해 고민했다. 영국이 최대 교역상대국인 반면, 프랑스는 독립전쟁의 우방국이었다.
결국 사태해석에 가장 현명하다는 대법원의 의견을 구했다. 이때 존 제인은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몸소 구현하였다.
 [프로필] 김 우 일
[프로필] 김 우 일
• 현)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
• 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
• 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
• 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