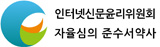![우리은행이 7일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기업금융 명가 재건 전략 기자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의에 답변중인 강신국 우리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장 모습. [사진=우리은행]](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936/art_16940671444237_18cd91.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기업금융 명가 부활을 천명했다.
차별화된 서비스로 시장을 선도하고, 기업과 동반성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매년 스타트업 기업과 국가경제에 필요한 신성장 산업 영역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고, 동시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7일 우리은행이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기업금융 명가 재건 전략 기자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신국 우리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장과 정진완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장을 비롯해 우리은행 내 대기업‧중소기업 부문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먼저 강 부문장은 “기업금융 강화의 목적은 금융이 자금의 중개기능을 충실하게 해서 돈이 흘러가야 할 곳으로 흘러가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이를 실현하기 위해 스타트업 대상 지원과 스케일업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강 부문장은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취임 당시 ‘기업명가’를 선언했고 이후 3~4개월이 지났다. 신성장 산업에 (임 회장 취임했을 당시인) 3월 대비 5조1000억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스타트업, 중소, 중견, 대기업 등 기업 대상 여신을 늘리면서 리스크가 확대될 상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손철수 우리은행 대기업 심사부 부장이 답했다.
손 부장은 “건전성 강화를 위해 여신 관리, 모니터링 등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현장에 가까이 가서 심사를 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여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현장 가까이 ‘직접심사부’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부문장은 기업금융 여신 확대로 자본비율에 데미지가 있을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 “전체 포트폴리오를 보면 가계대출이 줄었다. (중소, 대기업 등) 대출 늘려도 자본 비율에 큰 무리가 없다.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자산증대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이 7일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기업금융 명가 재건 전략 기자간담회'를 실시한 가운데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의에 답변중인 정진완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장 모습. [사진=우리은행]](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936/art_16940671441852_1c61ad.jpg)
해당 우려에 대해선 정 그룹장도 의견을 보탰다.
정 그룹장은 “자본관리 효율성 때문에 중소기업 여신을 늘리는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신성장 등 국가경제에 필요한 부분, 제조‧정보 통신 등 상반기에 많이 투자했다. 순수하게 여신만 늘린다면 문제가 있겠으나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쪽, 돈이 흘러가서 고용 등 2차 효과가 날 수 있는 쪽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