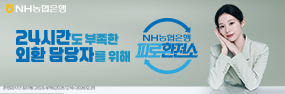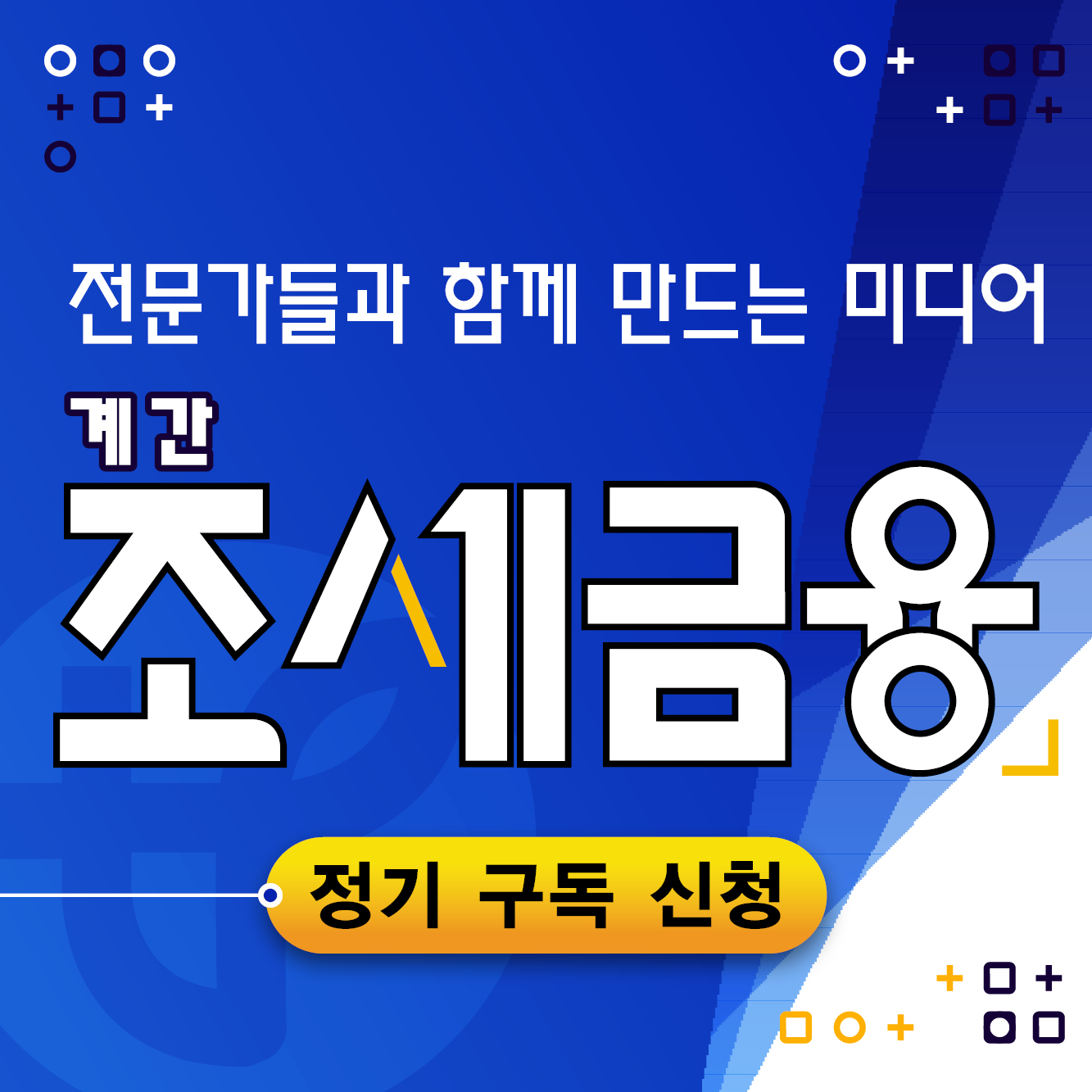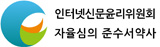![[이미지=셔터스톡, 편집=최주현]](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7453625832_a4dd2c.png)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도교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신선 사상에 노장사상∙유교∙불교 등을 결합하여 불로장생과 현세의 축복을 추구한다. 도교가 그 당시 권력과 자본에 대하여 개혁적인 사고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항상 핍박과 했다.
원초적 질서인 기(氣)에서 나오는‘도(道)’가 시공을 초월하여 만물과 우주의 근원이 된다. 상제(上帝)는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로서 인간과 만물을 주재하고 천지와 길흉화복을 점지한다. 초제(醮祭)는 자연 재난과 질병을 다스리는 태일(太一)을 비롯한 별에 대한 숭상의 표현이었고, 하늘에 도달하기 위하여 현세의 신선계인 삼신산(三神山)으로 도성을 장엄하고 오악(五嶽)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도교의 신선사상
도교는 주문을 외우는 사람이 상급 귀신이 되어 하급 귀신을 복종시킨다. 5세기에 경전인 도장(道藏), 사원인 도관(道觀), 사제인 도사(道士)가 확립되었다. 남조의 육수정(陸修靜, 406∼477년)이 경전을 정리하였고, 배례(拜禮)·송경(誦經)·사신(思神)의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도교는 서진(西晉)과 동진(東晉), 남북조시대를 거쳐서 일반 민중에 전파되었다.
사람이 수련을 쌓아서 득도하면 진인(眞人), 성인(成人) 또는 신인(神人)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신선이 되는 비승(飛升)은 신선이 되어서 죽지않고 천상 선계로 올라간다. 비천(飛天)은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면서 죽지 않고 하늘로 간다. 은화(隱化)는 죽는 형식만 취하고 신선이 되지만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 시해(尸解)는 오행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신선이 된다. 그리고, 검시해(劍尸解)는 사용하던 검을 세우고 죽으면 신선이 되고 가족이 그 검을 매장한다.
도교에서 죽지 않는 신선이 되는 불로장생의 선약은 단사, 황금, 백은, 영지, 오옥, 운모 등을 활용하면서 상약, 중약, 하약으로 구분했다. 상약은 완전히 신선일 될 수 있는 특수한 약이고, 중약은 몸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약이며, 그리고 하약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다.

![[도교의 도관] 신선사상에 기초하여 신을 모시는 도교의 사원이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7450879886_799079.jpg)
도성을 장엄한 삼신산
신선이 사는 삼신산(三神山)은 발해의 봉래산(蓬萊山), 방장산(方丈山), 영주산(瀛州山)이다. 이 산들은 사람이 가까이 가면 바람을 일으켜서 배를 멀리 떠내려 보내서 도달할 수 없다. 주위가 3만리이고 꼭대기의 너비가 사방 9천리이며, 산과 산 사이가 7만리 떨어져 있다.
정상에 선인(仙人)들이 사는 어전(御殿)이 있고, 주변에 불로불사(不老不死)의 과일나무가 있다. 진나라의 서복은 진시황의 방사로 불로장생의 불로초를 찾아서 3천여명을 이끌고 영주산(한라산)을 찾았다. 한무제는 정원인 상림원(上林苑)을 조성한 후 연못에 봉래산과 영주산을 축조했다. 한나라 때에 신선이 좋아하고 머물 수 있는 곳에 누각을 세우고 경양산(景陽山)을 조성했다.
하늘의 신선에게 제사를 지내는 오악(五岳)은 동서남북과 중앙 지역을 대표하는 산이다. 중국의 오악은 동악 태산(泰山), 남악 형산(衡山), 중악 숭산(嵩山), 서악 화산(華山), 북악 항산(恒山)이다. 태산이 우두머리인 대종(宗)으로 천자가 정상에서 천제(封)와 지제(禪)를 행했다. 천자는 새로운 왕조를 열고 태평성대를 이루면 태산에서 봉제(封祭)를 지내거나 양부산에서 선제(仙祭)를 드렸다(오경통의).
훌륭한 천자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있는 군주만이 가능했는데 진시황과 2세 황제, 한의 무제(7번)·광무제·장제·안제, 당의 고종·측천무후·현종, 북송의 진종·휘종, 원의 쿠빌라이, 청의 강희제·건륭제(6번) 등이 지냈다. 측천무후는 태산이 아닌 숭산(嵩山)에서 봉제인 봉선을 행했다. 신나라 왕망은 동지에 남교(南郊)에서 천신에게 제사하고, 하지에 북교(北郊)에서 토지신에 제사했다.
백제의 삼신산과 오악
백제 온조왕은 도성인 한성 남쪽에 남단(南壇)을 쌓고 2월에 교사(郊祀)를 지냈다. 건국신화에 나오는 동쪽 높은 산이 검단산으로 백제 왕들은 숭산(崇山)인 검단산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한성은 삼신산인 검단산(崇山), 아차산(釜山)∙청량산(漢山)을 중심으로 도성을 조성하였다. 웅진성은 삼신산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공산성을 중심으로 계룡산(崇山)과 금강 너머의 취리산(釜山)이 위치하고 있다. 사비성은 부소산(日山)·금성산(吳山)·무산(浮山)을 삼신산으로 산 정상에 신인(神人)이 살면서 서로 내왕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또한, 한성시대와 웅진시대의 오악은 알려져 있지 않았고, 사비시대의 오악은 북쪽의 오산(오서산 또는 성주산), 동쪽의 계람산(계룡사), 남쪽의 무오산(지리산), 서쪽의 단나산(월출산), 중앙에 조조산(모악산)으로 비정되고 있다.
삼신산으로 알려진 금강산(봉래), 지리산(방장), 한라산(영주)은 조선 후기 이중환의 택리지에 근거하고 있다. 신라와 고려의 오악은 토함산(동악), 계룡산(서악), 지리산(남악), 태백산(북악), 팔공산(중악)이었다.
조선에서 금강산(동악), 묘향산(서악), 지리산(남악), 백두산(북악), 삼각산(중앙)이었지만, 성리학의 주도로 모두 폐사되었다가 명성황후가 계룡산에 중악단을 재건하였다(1876).




![[백제의 오악] 계룡산, 성주산, 모악산, 지리산, 월출산은 백제시대부터 현재까지 중요한 도교사상의 중심지가 되었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7451028726_2fbf3d.jpg)
한반도 도교의 흔적들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사들의 요청으로 중국의 무신(武神)인 관왕묘(關王廟)를 세웠다(1598년). 남관왕묘, 동관왕묘, 성주·강진·안동·남원의 관왕묘 등이 건립되었다. 조선에서 관왕묘를 중심으로 국가의 제례와 민간의 제재초복(除災招福)으로 숭배되었다.
관우는 병마와 재앙을 없애는 신이며, 무속의 장군신인 관성제군(關聖帝君)으로 숭배했다. 한편, 마니산 참성단(塹星壇)은 고려시대부터 매년 봄과 가을에 하늘의 별들에 초제(醮祭)를 지낸다.
도교는 사회 참여를 하지 않다가 조선 말기에 동학을 통하여 소외계층을 대변했다. 박기홍과 김용식은 관우 숭배단체와 무속인들을 모아서 관성교(關聖敎)를 조직했다(1924년). 지극 정성으로 관우의 신명을 받들면 관운장신이 현몽한다고 믿었다.
본부인 숭인동의 '동묘(東廟)'와 공주 계룡산의 '무량천도(無量天道)'가 중심이었다.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관왕묘에 참배하고, 출생일 5월 13일과 사망일 6월 24일에 제사를 지냈다.

![[명성경, 관왕묘와 관성묘] 임진왜란 때 명나라 요청으로 관우의 관왕묘인 동묘를 세웠고, 관성교는 관우를 신격화하여 경전인 명성경과 사당인 관성묘에서 제사를 지낸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7451061741_be85c5.jpg)
우리나라와 일본의 신흥종교들은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현세의 축복을 추구하고 있으며, 도교는 인내천 사상이나 상생사상 등의 기반이 되었다. 삼신산과 오악으로 불렸던 산들은 풍수경관이 좋기때문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도성 주변에 위치했던 일부 삼신산은 도심의 개발로 그 역사나 중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프로필] 구기동 신구대 보건의료행정과 교수
•(전)동부증권 자산관리본부장, ING자산운용 이사
•(전)(주)선우 결혼문화연구소장
•덕수상고, 경희대 경영학사 및 석사, 고려대 통계학석사,
리버풀대 MBA, 경희대 의과학박사수료, 서강대 경영과학박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