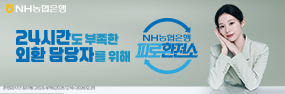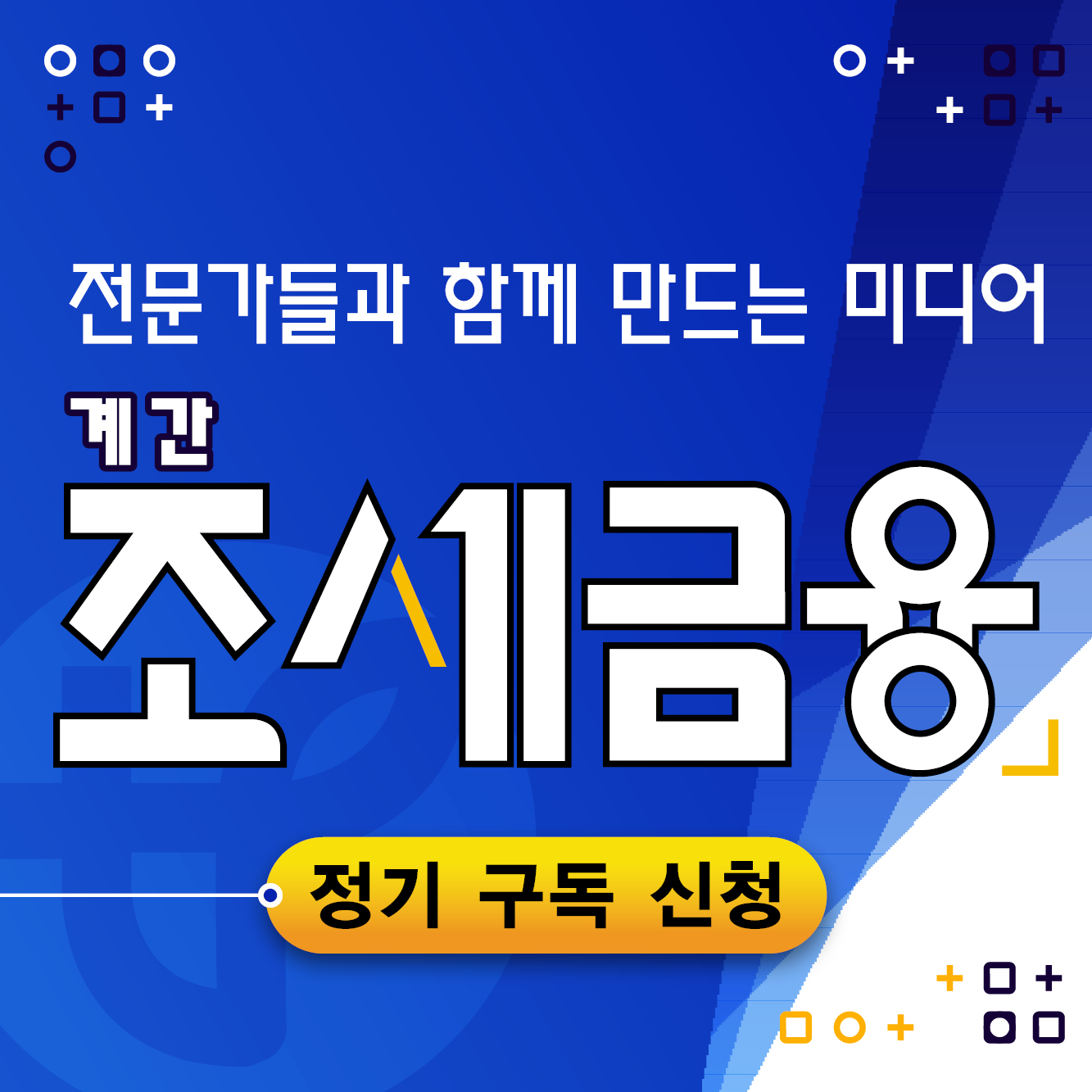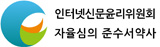![[사진=내부자료]](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3/art_17491162055796_ddf770.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폰지사기 피해자가 폰지사기로 얻은 수익금을 이익이라고보고 과세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청구구장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전1337, 2025.05.08.).
불법도박으로 돈을 번 일당이 국세청에 적발되면 과세대상이 된다. 불법도박을 이용해 돈을 벌고 무사히 빠졌어도 과세대상, 불법도박 피해자라도 특정 과세기간 내 도박으로 이익이 났다면 역시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회수 못하는 건 사기 일당과의 채권‧채무문제이며, 세금 역시 일종의 채권이다. 한 번 형성된 채권‧채무는 사기 행위와 별개로 작동한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화장품 판매수익 배당을 미끼로 투자를 모은 회사 A 때문인데, 이 회사는 2014년 7월 8일 설립돼 투자자를 모았고, 2019~2020년에 약정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뿌렸다.
그러나 A가 폰지사기라는 게 수사당국에 적발, 2021년 10월 A사 대표가 구속되었고, 같은 해 11월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에서 2023년 2월 상고기각되며 유죄가 확정됐음. A도 2023년 6월 7일 파산선고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앞서 2021년 9월 A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나, 재판 때문에 조사를 중단했고, 2023년 A사 대표가 유죄확정되자 중단되었던 세무조사를 재개했다.
A사 투자자 중 일부가 2019~2020년 A사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그해 소득으로 세금신고하지 않았다며, 2023년 4월 과세통보를 보냈다.
투자자들은 사기 당한 것도 억울한데, 2년 정도 받은 수익금에 세금을 붙이는 게 맞냐며 사기 손실 총액이 수익금을 상회하여 수익 자체가 없으니 심판원에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2025년 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서울국세청은 2019년과 2020년 해당시점에는 A사와 약정에 의한 투자 수익금을 받은 건 맞고, 당해 발생한 소득은 당해 신고하는 것이 맞는다고 반박했다.
서울국세청의 논리를 풀어서 설명하면,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과세하는 원칙이 있긴 한데, 2019년, 2020년에 지급된 수익금은 A사 약정에 의해 당해 지급 결정 및 확정된 금액이고, 따라서 권리 귀속시기 역시가 지급 결정 및 확정된 금액이다.
수익금의 원천이 되는 투자원금의 회수여부에 따라 수익 및 이자수익금 귀속시기가 달라진다면,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 체계의 본질마저 의미가 없게 된다.
게다가 세금은 돈만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인데, 돈을 번 수단이 범죄냐, 합법이냐 또는 범죄피해자의 수익이냐에 따라 과세를 달리한다면, 과세행정이 아니라 수사행정이 섞이고 범죄수익금에 대한 과세 여부까지 뒤죽박죽이 되어 버린다.
심판원은 ‘청구인들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수익금을 받았어도 사기 피해금을 합치면 손해이니 세금을 과세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의 기간과세 세목에 해당하고, 해당 수익금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점, 청구인들은 여러 개의 개별 투자거래를 하였고 원리금을 다시 재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4년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내용과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