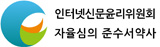![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938/art_16949947326061_958e75.png)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의료 사고를 당한 환자 측이 병원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기존보다 완화된 입증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한 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병원에서 수술받다 혈압이 떨어져 심정지로 숨졌다. 유족은 2019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이 재단을 상대로 1억6천여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은 담당 의사가 환자를 소홀히 감시했고 간호사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않아 A씨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담당 의사는 A씨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하고 약 30분 뒤 간호사에게 감시할 것을 지시하며 수술실을 비웠다. A씨의 혈압이 계속 내려갔지만 의사는 전화로 혈압상승제를 투여하라고 지시할 뿐 수술실로 돌아오지 않았다.
뒤늦게 돌아온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A씨를 큰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심정지로 사망했다.
1·2심 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약 9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단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의료사고 소송에서 환자 쪽이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완화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환자 쪽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행위를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가 기존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증명해야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증 기준이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데다 치료 지연이나 환자 방치 등 적극적 행위가 없는 경우 피해를 배상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법원은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에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환자 측이 과학적·의학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개연성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도 봤다. 다만 의학적 원리에 부합해야 하며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환자가 입은 손해가 의료상 과실로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점을 의료행위를 한 의사·병원 등이 증명하면 이 같은 인과관계 추정은 깨질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진료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법리를 정비해 새롭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